한여름 소나기
저 멀리서 올 때는
바람에 마른 잎 구르는 소리 같았다
옆집 마당에 왔을 때는
급하게 달리는 수십 마리
말발굽 소리 같았다.
우리 집 마당에 닥쳐서는
하늘까지 컴컴해지고,
하늘이 마른 땅에 대고
큰 북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빨래 걷을 틈도 주지 않고
금세 또 옆집으로 옮겨 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Image from Pixabay
이 시는 한여름 소나기의 발걸음을 청각으로 읽는 느낌이다.
먼 곳에서 다가올 때는 바람에 이끌린 마른 잎처럼 가볍고도 은근하다. 하지만 이내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거칠어지고, 옆집 마당에서는 달려오는 수십 마리 말발굽 소리로 변한다. 그 순간, 우리 집에 닿았을 때는 세상이 단숨에 어두워지고, 하늘이 북을 치듯 땅을 두드린다. 짧지만 강렬한 방문, 그리고 미련 없이 떠나는 발걸음을 마치 스테레오 사운드로 듣는 느낌이다.
이 소나기는 마치 예고 없이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불청객 같다. 예고도 없이 찾아와서 빨래를 걷을 틈조차 주지 않고 떠나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냉정함도 있다. 세월이 그렇고, 사랑도 그렇다.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젖은 공기와 그 순간의 기억뿐이다.
시인은 소리의 변화를 통해 소나기의 거리와 힘을 섬세하게 그렸다. 멀리서 다가오는 잎사귀 소리, 가까워지며 말발굽이 되고, 마침내 북소리가 되는 흐름은 여름비의 짧고 격정적인 생애를 압축한다. 읽다 보면 귀로 빗소리를 듣고, 눈앞에 하늘빛이 어두워지는 장면이 그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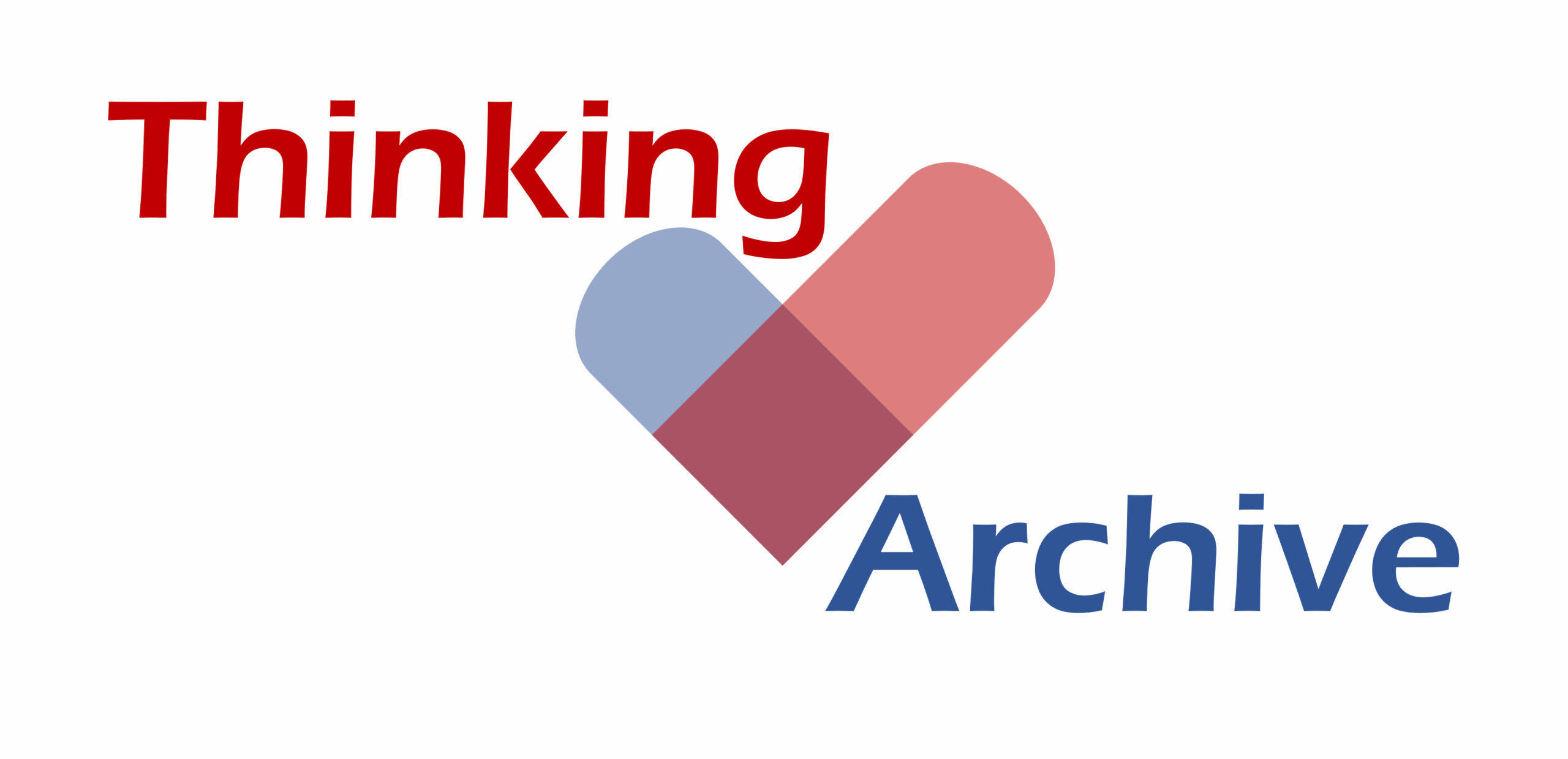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