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下山)
언젠가부터 나는
산을 오르며 얻은 온갖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했다
평생에 걸려 모은 모든 것들을
머리와 몸에서 훌훌 털어버리기 시작했다
쌓은 것은 헐고 판 것은 메웠다
산을 다 내려와
몸도 마음도 텅 비는 날 그날이
어쩌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된들
사람살이 겉과 속을
속속들이 알게 될 그 날이
Image from Pixabay
이 시〈하산(下山)〉은 인생의 무게와 덧없음을 산의 오르내림에 빗대어 풀어낸다. 산을 오르는 동안 쌓아온 것은 곧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집착을 뜻하고,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는 장면은 오래 지닌 욕망과 기억을 털어내는 순간처럼 다가온다. 시의 화자는 산에서 내려오며 결국 빈손이 되는 과정을 담담히 말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는 오래 지닌 상처와 고독이 숨어 있는 것 같다.
다른 이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은 늘 우리를 외롭게 한다. 때로는 오해로 남고, 때로는 침묵으로 흩어진다. 나의 진심이 건너가지 못해 멀어지는 순간, 그 허무가 마음 깊은 곳에서 무겁게 일어난다. 시 속의 ‘훌훌 털어버림’은 단순한 비움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을 다 품지 못한 채 남겨진 공허함과 닮아 있다. 삶이란 결국 서로의 안쪽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안고 흘러가고, 인생의 끝에서 비로소 ‘사람살이 겉과 속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시를 읽고 있으면, 관계의 상처와 허무가 동시에 떠오른다. 산을 다 내려왔을 때 텅 빈 몸과 마음은 마치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려다 끝내 닿지 못하고 돌아서는 순간처럼 쓸쓸하다. 그러나 시인은 그것조차 삶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받아들이며, 마침내 죽음을 또 하나의 하산으로 담담히 받아들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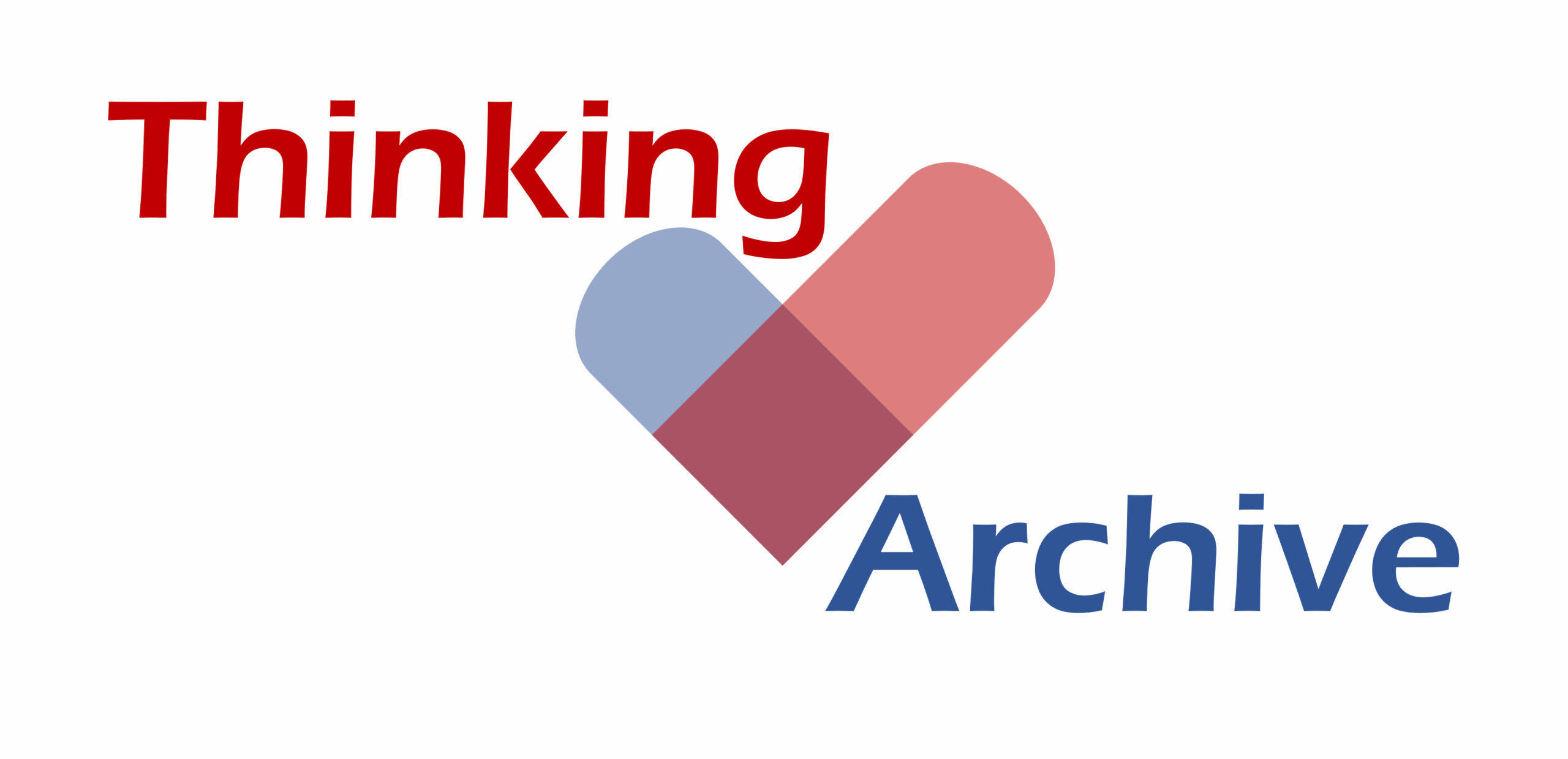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