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가을이 오면
그대 기다리는 일상을 접어야겠네
간이역 투명한 햇살 속에서
잘디잔 이파리마다 황금빛 몸살을 앓는
탱자나무 울타리
기다림은 사랑보다 더 깊은 아픔으로 밀려드나니
그대 이름 지우고
종일토록 내 마음 눈시린 하늘 저 멀리
가벼운 새털구름 한 자락으로나 걸어 두겠네
Image from Pixabay
이 시를 읽으면, 9월의 청명하고 고요한 하늘과 대조적으로 무거운 체념의 공기가 감도는 느낌이 든다. 8월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찬바람을 기다리듯이 일상 속에서 그대를 기다렸지만 끝내 그 기다림을 접겠다는 결심은 절망의 다른 표현 같다. 사랑을 잃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그 빈자리는 아무리 닫으려 해도 끝내 열려 있는 듯.
간이역 햇살 속 탱자나무 울타리는 환한 빛으로 물들어 가지만, 그 빛을 바라보는 기다림은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 그저 남겨진 사람의 습관처럼 남아, 몸살보다 더 오래 죽지않을 정도로 아프게 스며들뿐.
‘그대 이름 지우고’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지우지 못한다. 지운 이름 대신 눈시린 하늘에 걸어둔 구름 한 조각은, 아직도 그대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의 결심은 단호하기보다, 체념과 미련이 교차하는 슬픈 자기 위안에 가깝다.
포기한다는 건 단순히 놓아버리는 일이 아니다. 결심은 하지만 실행은 하지 못한다. 오히려 더 깊이 기억하고, 기억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일지도 모르겠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과 눈부신 햇살 속에 슬픔이 느껴지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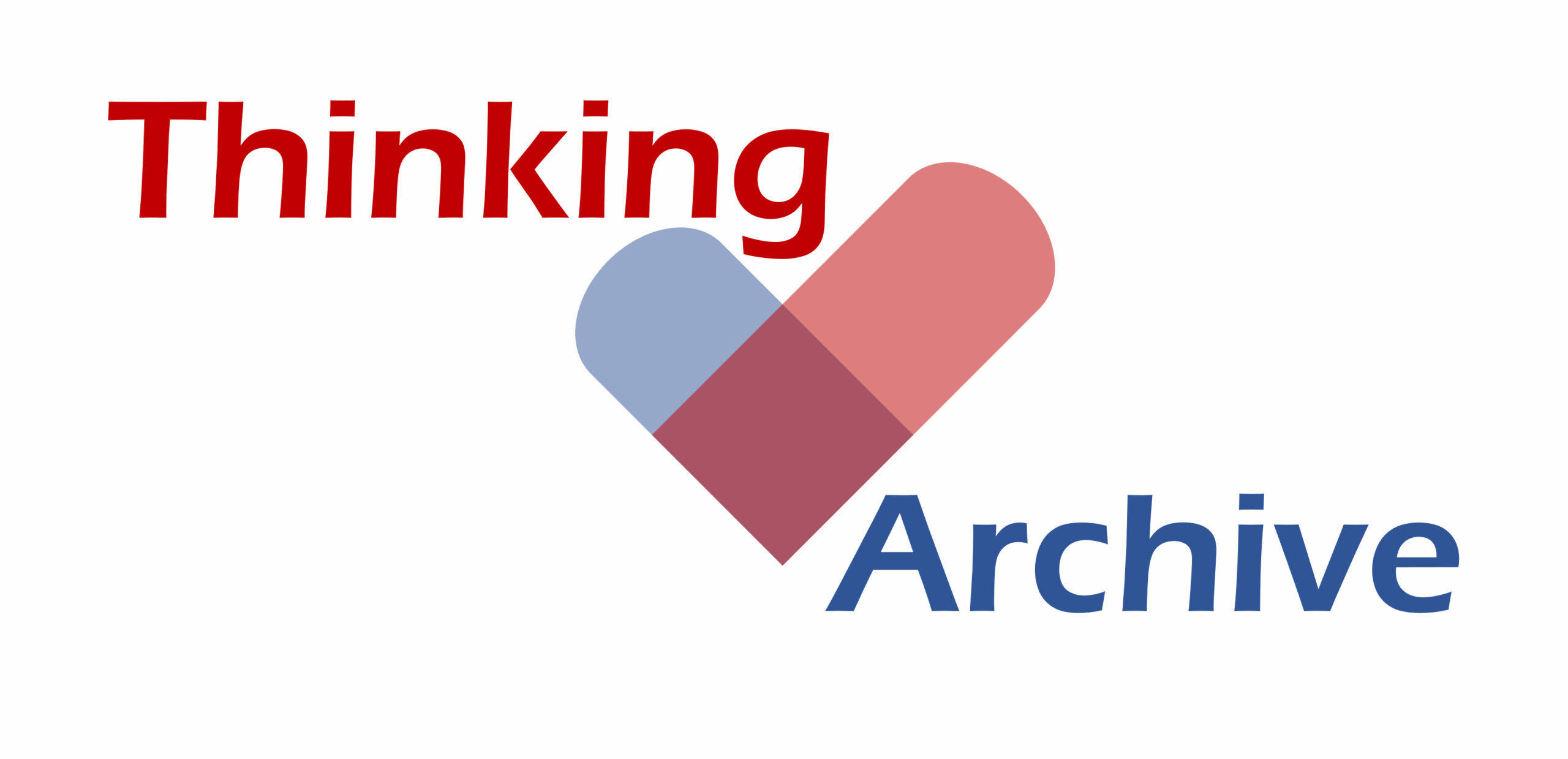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