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을 들어 별을 그린다
어둔 밤 부엉이 울음이
빛을 떠난
산 그림자 보다 더
외로운 것은,
잠 못 드는 밤에
제일 맑고 빛나는
별 하나 안고
피던 꽃잎 때문일까.
바람이 잠든 물 위에
별 하나 담구고,
밤마다 내려오는 하늘은
곁 눈짓으로 속삭임 감추며
붓을 들어 별을 그린다.
Image from Pixabay
시 속에서 별은 밤마다 다시 떠오르는 무한한 존재로 나타낸 느낌이다. 그것은 시공을 넘어 늘 빛을 내고,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꺼지지 않는 생명의 상징처럼 보인다.
반면, 부엉이의 울음은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고, 꽃잎은 피었다가 곧 흩어지는 유한한 아름다움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의 결을 가진 이미지들이 나란히 놓일 때, 별은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며 더욱 선명하게 빛난다.
시인이 별을 그린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유한한 것들의 덧없음 속에서 무한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일 것이다. 별빛이 떠난 산 그림자와 공허하게 퍼지는 부엉이의 울음은 외로움을 드러내고, 꽃잎은 기억처럼 남아 사라지지만, 별은 그 모든 것 위에 아득히 빛난다. 시인은 아마도 이 차이를 느끼며, 손에 붓을 들어 무한한 별을 새겨 넣으려 했을 것이다.
이 시는 유한과 무한 사이에서 생겨나는 간극을 애틋하게 보여준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잔함, 그리고 끝없이 맑고 빛나는 것에 대한 경외가 함께 어울린다. 별을 그려보는 행위는, 곧 덧없는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한을 꿈꾸는 방식이자, 순간의 상실을 견디는 은밀한 위안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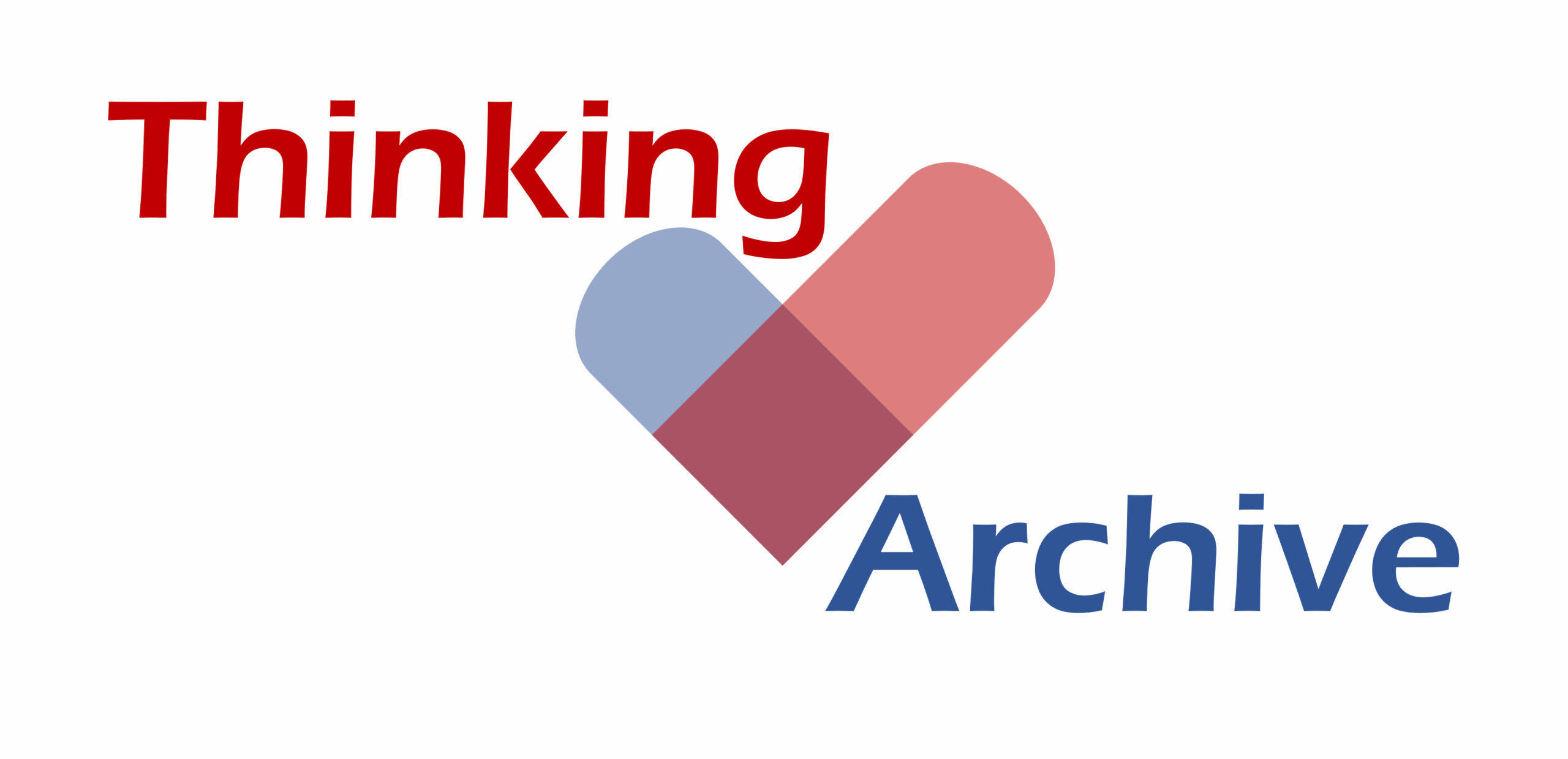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