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yone who has something to hide or must hide something loses the open and free gaze.”
– Stefan Zweig, Beware of Pity (Ungeduld des Herzens, 1939)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거나 숨겨야 하는 사람은, 열린 시선과 자유로운 눈빛을 잃어버린다.”
– 슈테판 츠바이크, 『연민 (초조한 마음, Ungeduld des Herzens)』
이 문장은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가 인간의 내면을 해부하듯 섬세하게 그려낸 장편소설 연민(이은화 역, 지식의 숲, 364쪽) 속에 등장한다.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변방에 위치한 작은 주둔지 마을을 무대로 한다. 젊은 기병 장교 안톤 호프밀러(Anton Hofmiller)는 외딴 영지의 부유한 집안, 케케스팔바(Kekesfalva) 남작 가문과 가까워진다. 그곳에서 그는 남작의 딸, 에디트(Edith Kekesfalva) 를 만난다. 에디트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를 지닌 어린 여인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살고 있다. 호프밀러는 처음에는 단순한 동정심으로 그녀를 대하지만, 점점 그 동정은 연민을 넘어 자신이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으로 변한다. 그의 마음은 에디트의 기대와 사회적 체면, 그리고 스스로의 도덕적 불안 사이에서 갈라진다. 결국 호프밀러는 그녀의 애정에 대해 진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약속과 숨김으로 일관하게 된다. 츠바이크가 말한 “숨겨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호프밀러다.
츠바이크는 이 작품에서 연민과 죄의식, 그리고 ‘도덕적 자기기만’이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잠식하는지를 탐구한다. 그가 말하는 “열리고 자유로운 시선”은 단순히 눈의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투명성에 대한 은유다. 어떤 비밀을 품는 순간, 인간의 시선은 자신을 향해 굽어지고, 타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숨긴다는 행위는 언제나 ‘닫힘’을 낳는다. 눈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지만, 그 안쪽에서는 스스로를 감시하는 의식이 고여 흐르지 못한다.
이 문장의 핵심은 ‘숨김’이 곧 시선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진실을 감추며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지만, 결국 그 감춤이 인간의 가장 고유한 자유 – 타인을 향한 투명한 시선 – 을 앗아간다. 츠바이크의 인간관은 도덕적 판단보다 심리적 진실에 가깝다. 그는 인간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그 약함이 어떻게 마음의 자유를 침식하는지 조용히 드러낸다.
그리고, 이 작품이 쓰인 1930년대 후반은, 유럽이 전체주의의 그림자 속으로 빠져드는 시기였다. 따라서 “숨기려는 인간의 시선”은 단지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전체주의와 거짓된 도덕 아래에서 ‘양심을 숨긴 시대의 눈빛’을 상징한다. 이 문장은 결국, 한 개인의 내면적 타락이 곧 시대의 윤리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츠바이크의 경고로도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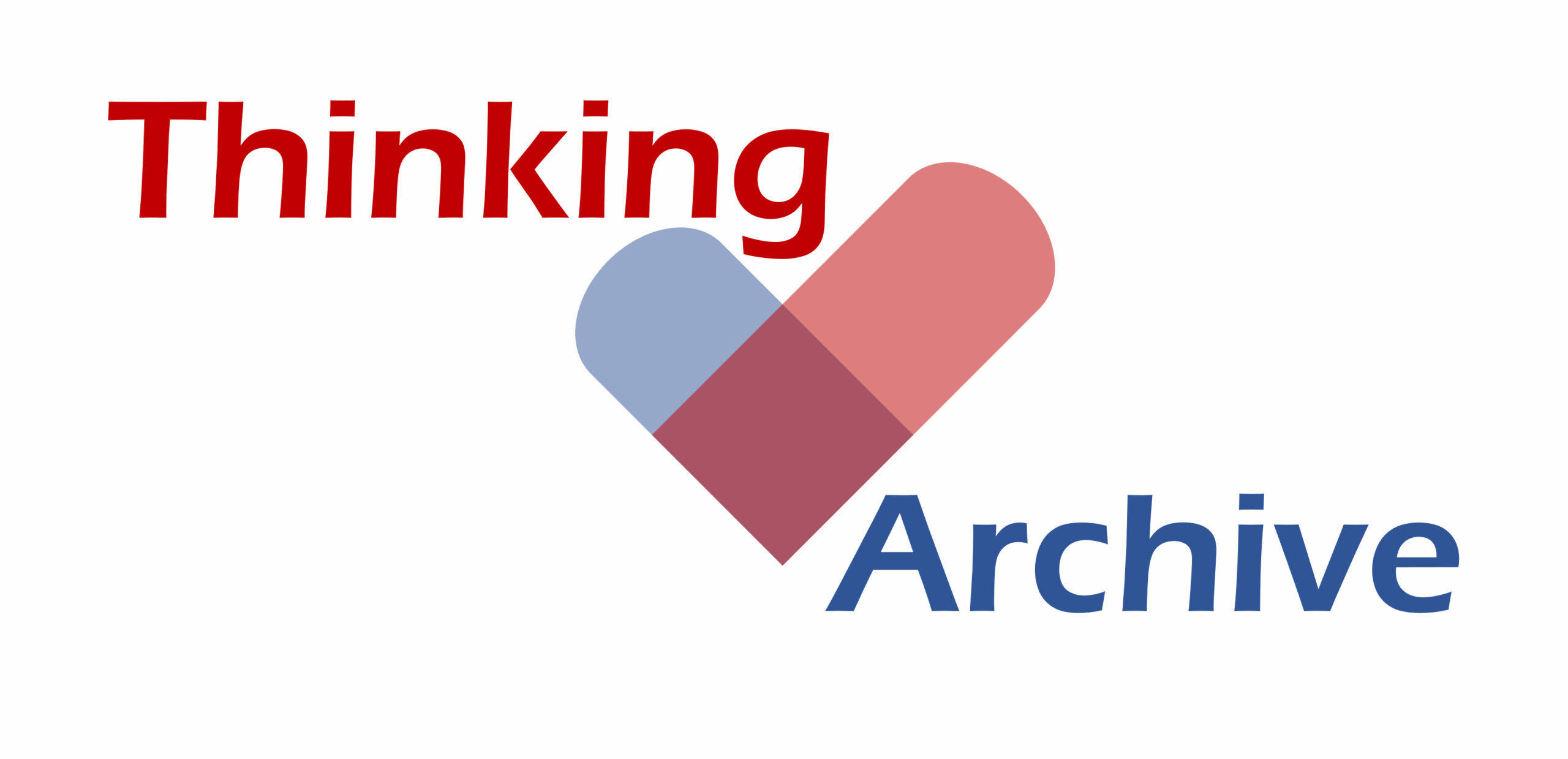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