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명이나물 한 잎 젓가락으로 집어 드는데
끝이 붙어 있어 또 한 잎 따라온다
아내의 젓가락이 다가와 떼어준다
저도 무심코 그리했겠지
싸운 적도 잊고
나도 무심코 훈훈해져서
밥 먹고 영화나 한 편 볼까
말할 뻔했다.
재미와 미소와 감동이 있는 시.
사소한 다툼 끝에 마주 앉은 식탁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기만 하다. 젓가락질 소리만 들리는 그 적막 속에서, 하필이면 얇은 명이나물이 서로 붙어 떨어지지 않는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다. 그 사소한 곤란함이 오히려 이 냉랭한 기류를 깨뜨리는 열쇠가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달라붙은 나물 잎을 떼어주는 아내의 젓가락, 그 행동에는 어떤 계산도 망설임도 없다. 제목처럼 정말 ‘무심코’ 나온 행동이다. 비록 서로 토라져 있어도 남편이 밥 먹는 것을 불편해하자 본능적으로 도와주려는 그 몸에 밴 배려가 참 뭉클하게 다가온다. 머리는 아직 화가 나 있을지 몰라도, 몸은 이미 상대를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네 오래된 연인이나 부부의 모습 같아 쉽게 웃음이 난다.
그 짧은 순간에 남편의 마음에도 봄눈 녹듯 따스함이 번진다. 방금 전까지의 냉전이 무색하게, 밥 먹고 영화나 보러 가자고 말할 뻔했다는 마지막 구절이 참 인간적이고 사랑스럽다. 거창한 사과나 화해의 말보다 젓가락 끝에서 전해진 그 사소한 챙김 한 번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어버린 것이다. 사랑이란 어쩌면 이런 사소한 ‘무심코’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단단한 매듭 같은 것이 아닐까 싶다.
‘말했다’로 끝을 맺었다면 그저 훈훈한 화해의 감동으로만 남았을 테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고 ‘말할 뻔했다’며 여운을 남긴 덕분에, 뭉클함 속에 슬며시 기분 좋은 웃음까지 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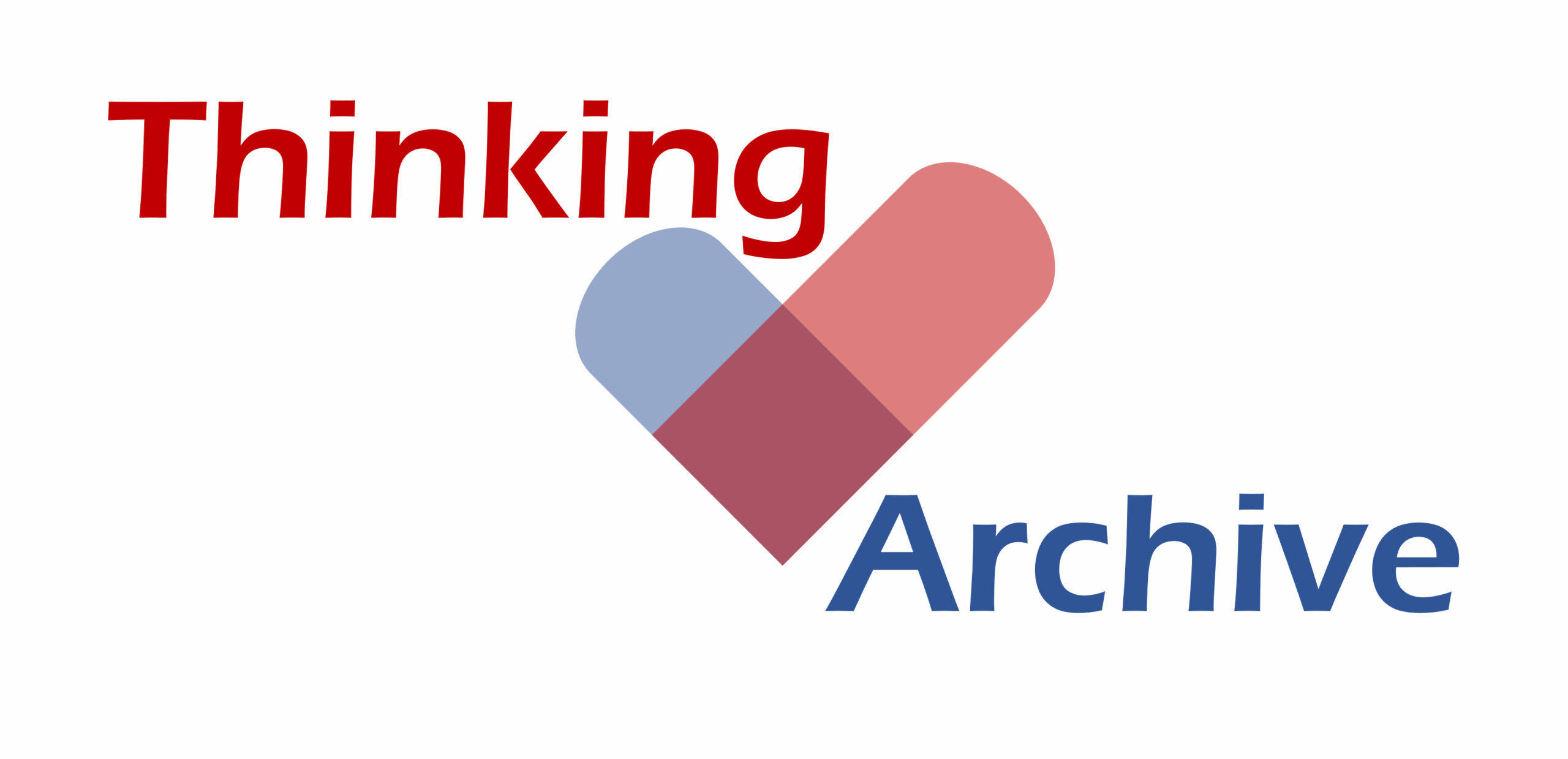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