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함민복
물울타리를 둘렀다.
울타리가 가장 낮다
울타리가 모두 길이다.
함민복 시인의 <섬>을 읽으면 사물을 보는 시인의 눈에 감탄하게 된다. 나 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섬은 파도에 고립되고 물에 단절된 장소로 흔히 떠올리지만, 시인은 오히려 ‘물울타리’라는 평범하며 친숙한 표현을 통해 새롭게 섬을 바라보게 만든다.
해발 0m이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이 울타리는 누구든 쉽게 넘나들 수 있는 포용성을 의미하고, 사방으로 난 그 울타리가 모두 배가 쉽게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대목에서는 더 이상 고립과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든 연결되는 소통의 장소로 변모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섬이라 하면 외롭고 쓸쓸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 시를 읽고 나면 섬이 마치 양팔을 벌려 모두를 환영하는 쉼터처럼 느껴진다.
낮게 깔린 물결이 곧 길이 되어 세상과 연결된다는 발상이 참으로 따뜻하고 경쾌하다. 물론 때로 홀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높은 파도로 가로막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환영하는, 연결하는 길로서의 울타리를 상상하니 마음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다.
시인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경계(함민복 시인의 주제어라는 느낌)가 사실은 서로를 향해 열려 있는 길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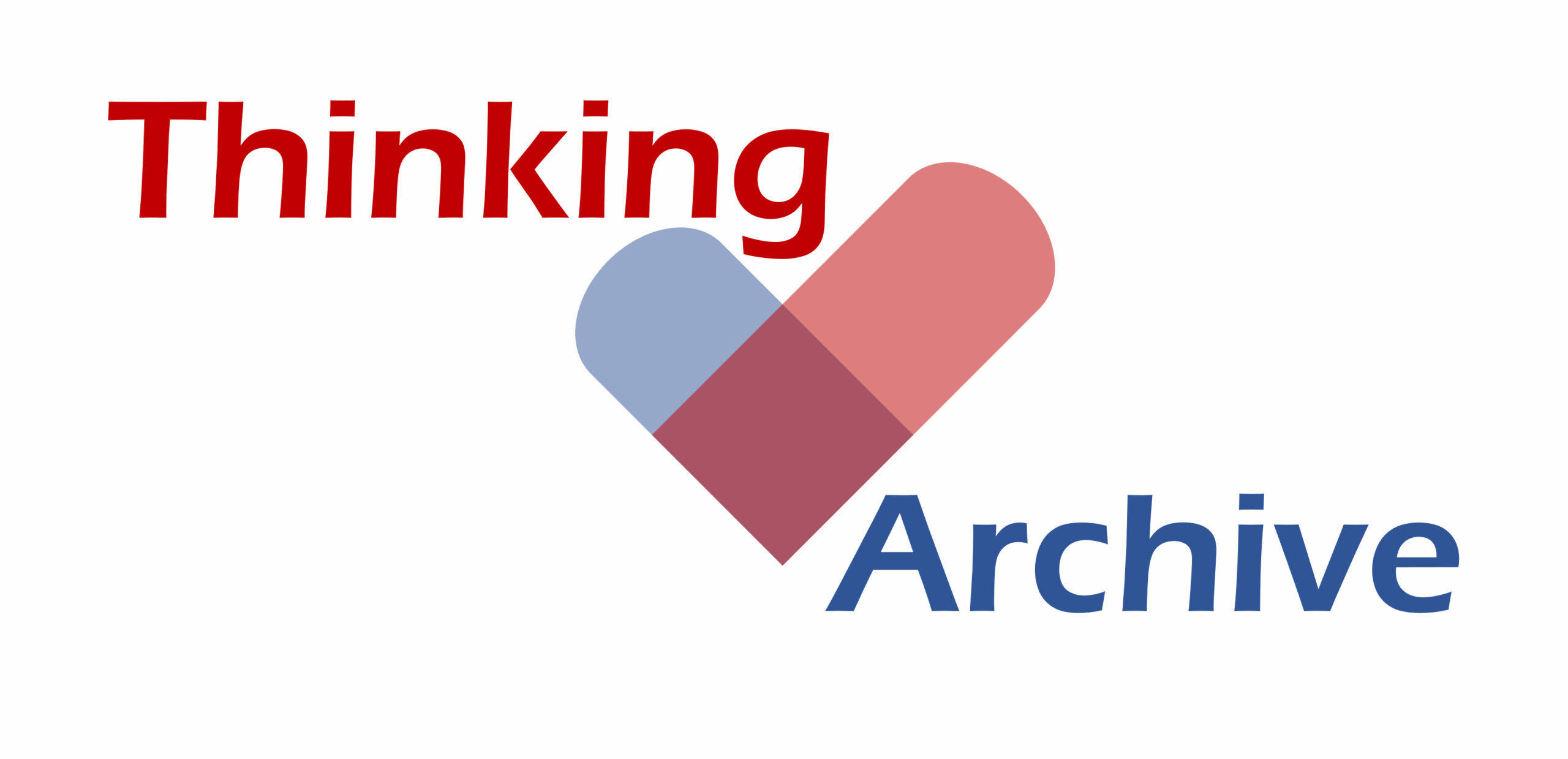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