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지 않은 말
이 시 속 화자는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가 가진 무게와 신비로 인해 끝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말해버리는 순간, 그것이 흔해지고, 숭고한 빛을 잃고, 거리마다 흘러넘치는 싸구려 말처럼 변질될까 두려운 것이다. 말은 언제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공기 속에 흩어지며 쉽게 소모되는 속성도 지닌다. 그래서 화자는 차라리 그 말을 땅속의 씨앗처럼 묻어두고, 돌의 심장부에 간직해 불변의 진리처럼 영글게 하려 한다.
이 시를 읽으면 언어가 가진 양면성이 떠오른다. 입술에 닿은 순간 무너지는 신성함, 그러나 발화하지 않으면 내면에서 더 깊고 단단해지는 힘, 표현되지 않은 채 간직될 때 더 숭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사랑의 고백이 언어를 통해 드러나지 못한 채, 오히려 언어 이전의 진실로 남으려는, 그래서 결국 표현되지 않는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쩌면 화자의 마음에 또 다른 목소리는 고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건, 그만큼 신성하기 때문이야.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켜내는 것이야’라고 하지만 사실은 두려운 것이다. 상대가 내 마음을 가볍게 받아칠까, 혹은 그 순간 나를 떠나갈까. 그 불안을 ‘숭고함을 지킨다’는 말로 덮어두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침묵은 고결함의 탈을 쓰고 있지만, 어쩌면 가장 솔직하지 못한 도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입술 끝까지 데려와 놓고도 삼켜버린 적이 있을 것이다. 눈앞의 사람에게 건네고 싶었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이 흔한 고백처럼 가벼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리라. 말해버리면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진심으로 전달되지 못한 채 그냥 흩어질 것 같았다. 그래서 차라리 가슴속에 묻어 두는 것 같다.
침묵 속에서 나는 매일 그 말을 되뇌지만, 상대는 모른다. 그 모름이 나를 고독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만의 비밀스러운 빛으로 만든다. 언젠가 돌의 심장부처럼 굳건히 간직만 하는 말. 그래서 웬지 모를 아픔이 느껴지는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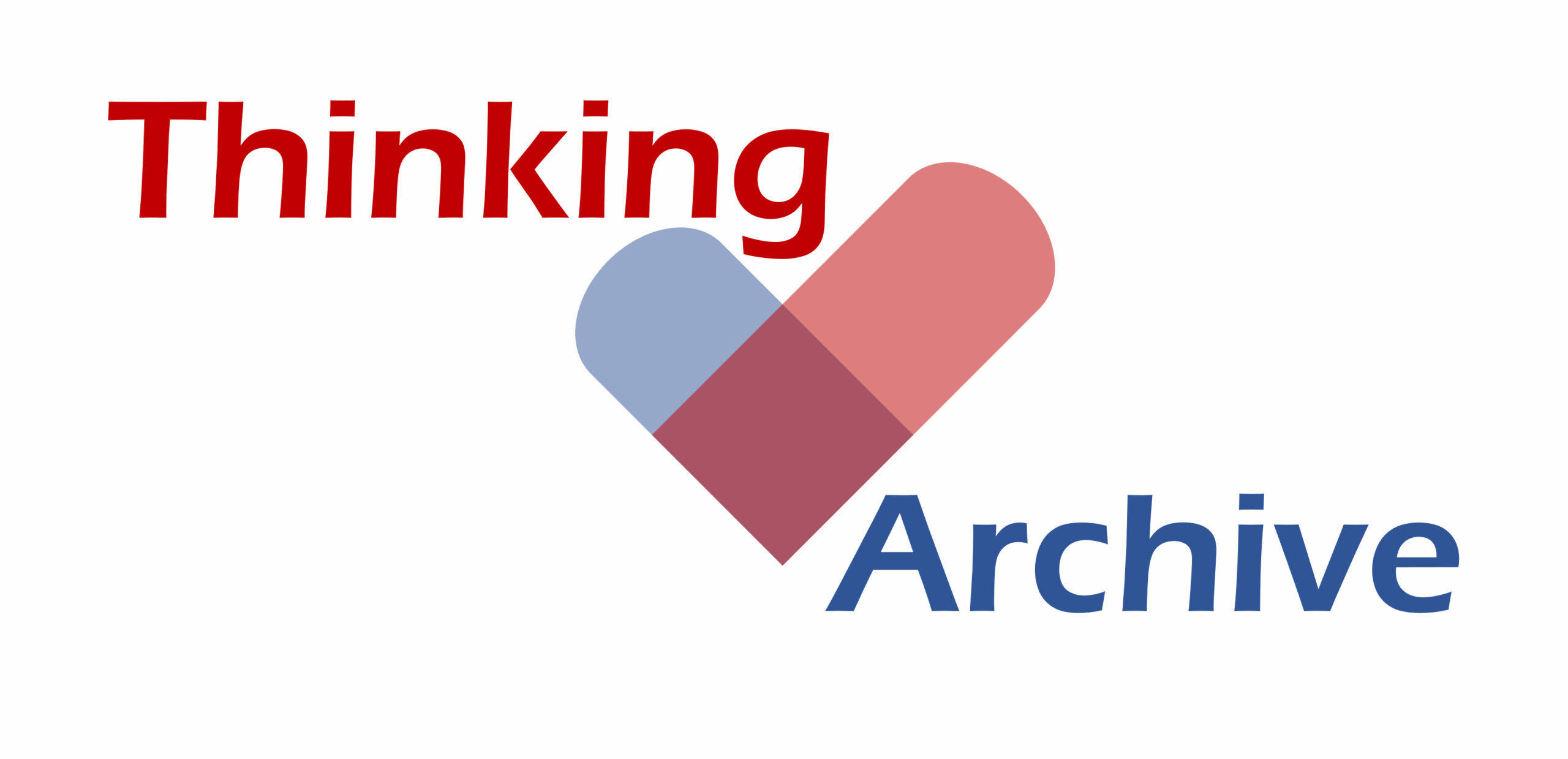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