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래 시인의 ‘저녁눈’을 읽으니 마음 한구석이 처연해지면서도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기분이다. 시에 등장하는 ‘말집’, ‘호롱불’, ‘조랑말’, ‘여물’ 같은 시어들은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나 빛 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지금은 쉽게 마주하기 힘든 옛 시절의 시골 풍경이 그려져 짙은 향수를 자극하고, 그 시절의 소박한 정취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이 시에서 가장 인상 깊은 점은 각 연을 마무리하는 ‘붐비다’라는 단어의 쓰임새다. 보통 ‘붐비다’라고 하면 사람들로 북적이고 소란스러운 시장통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 시에서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소리 없이 내리는 하얀 눈발이 호롱불 밑과 조랑말의 발굽 아래, 그리고 여물 써는 소리 곁에 가득 모여드는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진다. 역설적이게도 눈송이가 붐비면 붐빌수록 세상은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그 고요함 속에서 눈 내리는 풍경은 더욱 서정적으로 다가온다.
결국 눈이 가장 많이 붐비는 곳은 화려한 도심이 아니라 ‘변두리 빈터’라는 점이 마음에 긴 여운을 남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쓸쓸하고 소외된 공간을 눈발만이 찾아와 가득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다. 눈 내리는 저녁의 적막과 그 속에 담긴 따스한 시선이 어우러져, 읽는 내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평온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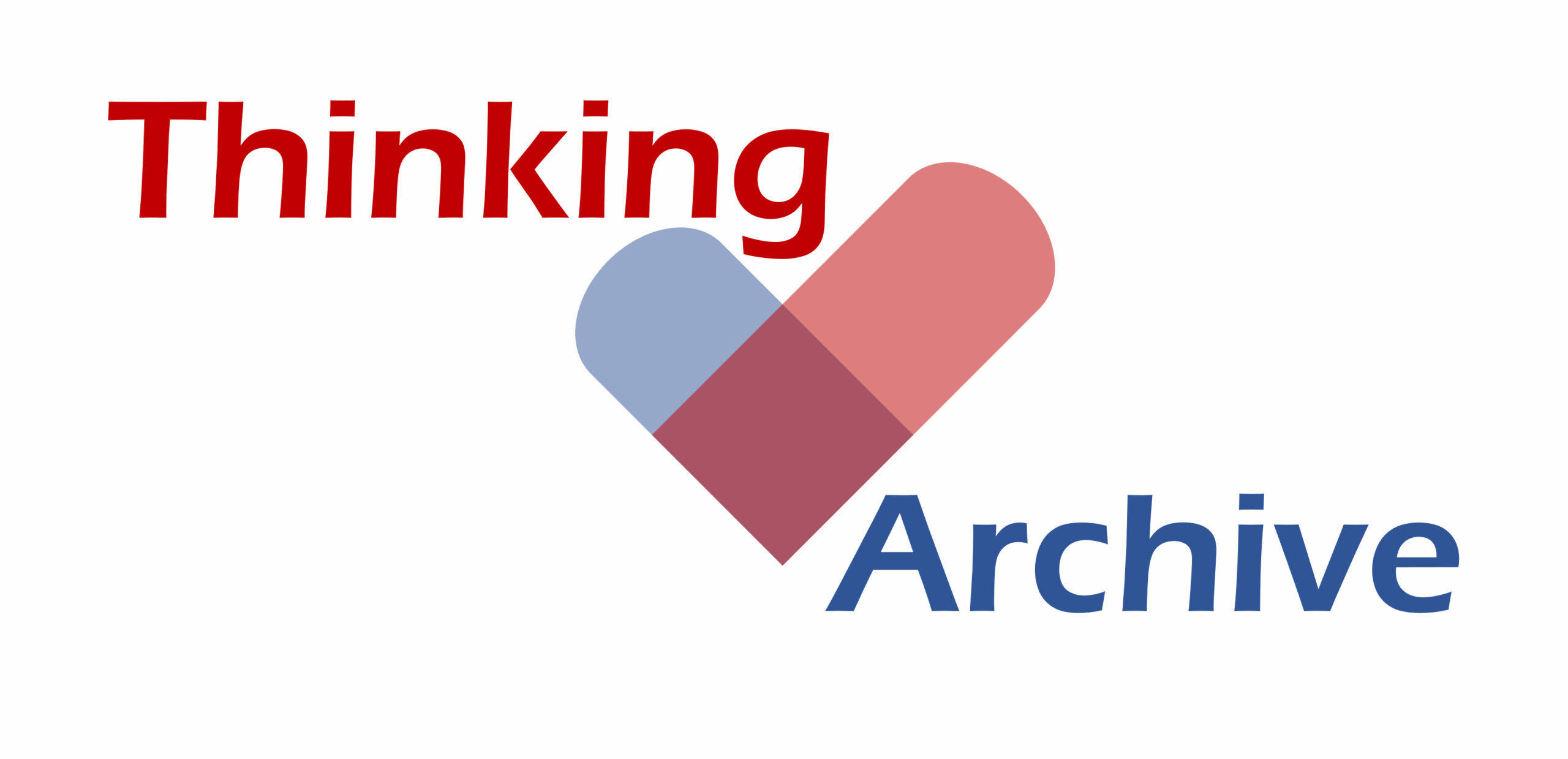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