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에서 소리가 난다.
산 냄새 나는 숲 속에서
또는 마음 젖는 물가에서
까만 밤을 맞이할 때
하늘에 별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위로가 된다.
자작나무의 하얀 키가 하늘 향해 자라는 밤
가슴 아픈 것들은 다
소리를 낸다.
겨울은 더 깊어 호수가 얼고
한숨짓는 소리,
가만히 누군가 달래는 소리,
쩌엉쩡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
바람소리,
견디기 힘든 마음 세워 밤하늘 보면
쨍그랑 소리 내며 세월이 간다.
고요한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비로소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시다. 작가는 별이 소리를 낸다는 감각적인 전이를 통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픔들이 사실은 각자의 방식으로 울고 있음을 나직이 일깨워준다. 숲의 향기와 물가의 축축한 공기 속에서 맞이하는 어둠은 단순히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비로소 입을 열기 시작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온다.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자작나무의 하얀 줄기는 마치 아픔을 견디며 성장하는 인간의 의지처럼 보인다. 그 밤에 작가는 가슴 아픈 것들이 내는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호수가 얼어붙으며 내는 비명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달래는 낮은 속삭임일 수도 있다. 시인은 인간의 고통을 고립된 것으로 두지 않고, 자연의 순리인 바람 소리나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와 연결하며 그 아픔에 보편적인 생명력을 부여한다.
얼어붙은 호수가 ‘쩌엉쩡’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것은 고통의 정점이자 동시에 변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소리는 견디기 힘든 마음을 다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이에게 전달되는 위로의 파동이다. 별빛이 부딪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세월이 간다는 표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상처 또한 깎여나가고 결국은 투명한 조각으로 남을 것임을 암시한다. 아픔을 소리로 치환하여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이 시는 슬픔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자연스럽게 소리 내어 울게 함으로써 얻는 정화의 과정을 담고 있다. 차가운 겨울밤의 이미지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이유는, 작가가 소외된 아픔들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슴 아픈 것들이 내는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밤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위안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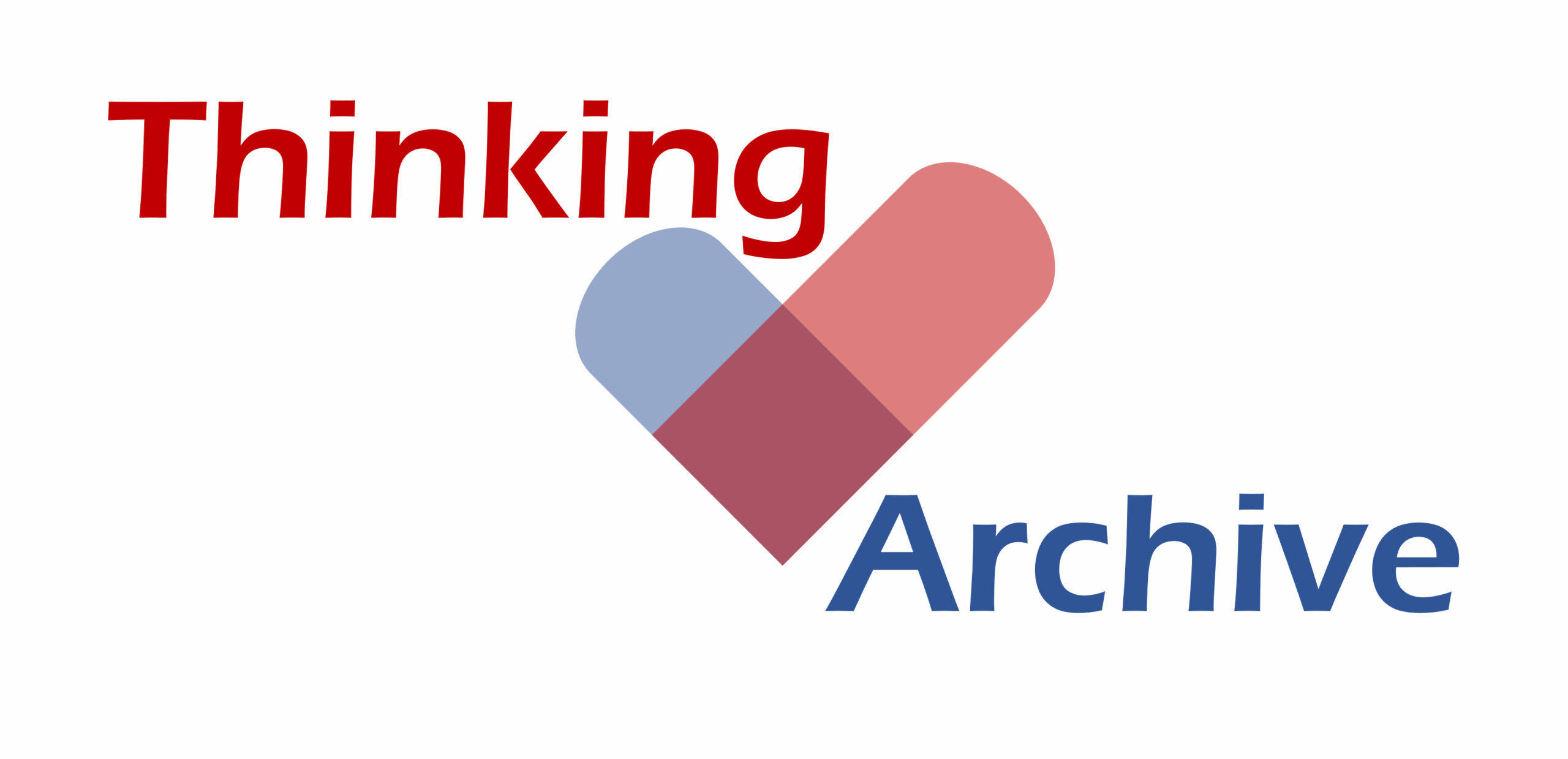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