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겨우 2년되었지만 배드민턴은 늘 가벼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땀 좀 흘리고, 웃다가, “한 점만 더!” 외치면 그날의 피로가 슬쩍 빠져나가는 운동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은 발이 미끄러지는 순간, 몸이 내 말을 안 듣더니 손목에서 심한 충격으로 작은 파업의 느낌이 들었다. 생애 첫 골절.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꺾일 수도 있구나 싶었다.
—
1. 미안한 감정
부상은 통증보다 먼저 감정으로 왔다. 미안함, 그리고 창피함.
넘어지는 순간 “아…” 하고 소리가 났는데, 바로 이어서 “괜찮아요!”가 자동으로 튀어나왔다. 손목이 딱 봐도 이상했는데도, 나는 아픈 걸 숨기고 싶었다. 정확히는 아픈 내가 분위기를 끊는 게 싫었다. 다들 멈춰 서서 나만 보게 되는 그 장면이 민망했고, ‘내가 이래서 경기가 망했다’는 공기가 싫어서, 꾹 참고 경기를 마쳤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묘한 예의다. 참는 게 예의인 줄 알고, 몸을 속인 거다.
경기가 끝나고 샤워실에 가서야 현실이 밀려왔다. 손목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통증은 심해지고 손목은 부어올랐다. 누군가가 “진짜 괜찮아?”라는 질문을 한다면 더 이상 대충 넘길 수 없게 됐다. 그리고 그때부터 미안함은 방향을 바꿨다. 코트에서의 미안함이 ‘분위기’에 대한 거였다면, 이후의 미안함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
부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 괜찮냐고 걱정해주는 따뜻한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함이 크다.
특히 아내가 떠올랐다. 아내는 원래도 돌볼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어머니, 이모, 이모부… 챙겨야 할 일이 이미 충분한데, 거기에 나까지 추가되는 느낌이 너무 미안했다. 내 손목에 금이 간 건 내 몸의 일이지만, 동시에 아내의 일정과 마음에도 무언가 하나 더 얹히는 일이다. 나는 “잠깐 불편한” 사람 하나가 되었고, 아내는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었다.
그래서 이 미안함은 “다쳐서 미안해”라기보다, “당신 삶에 번거로움을 하나 더 얹어서 미안해”에 더 가깝다. 대신, 미안함을 갚는 방법도 조금은 알 것 같다.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빨리 회복하는 것. 한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내가 하고, 정말 필요한 도움만 조심스럽게 부탁하면서, 내 몫을 조금이라도 지키는 것.
—
2. 기브스
처음엔 기브스가 꽤 낯설었다. 팔에 둘러진 단단한 하얀 덩어리가, 하루 종일 “너 조심해”라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움직일 때마다 걸리적거리고, 옷도 잘 안 들어가고, 샤워는 불가능하고, 머리 감는 것조차 거의 퀘스트가 된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짜증도 났다.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기브스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벌이 아니라 보호다. 뼈가 다시 붙을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고, 무엇보다 내 성격을 잠깐 멈춰 세우는 장치다. 나는 원래 웬만한 불편은 “괜찮아”로 밀어붙이고, 좀 아파도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속도를 내는 편인데, 기브스는 단호하다.
“지금은 멈춰.”
“지금은 회복이 먼저야.”
내가 나에게 못 해주던 말을 기브스가 대신 해주는 것 같았다. 덕분에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한다. 회복은 예전으로 100%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친 시간을 통과한 채로 다시 살아가는 일일지도 모른다. 기브스를 푸는 날이 끝이 아니라, 이 기간동안 배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
3. 한 손으로 하는 일상
기브스를 하고 나서야 알았다. 나는 하루에 손을 정말 많이 쓴다. 문 열기, 물 따르기, 칫솔질, 옷 입기, 머리 감기, 가방 지퍼 열기, 결제하기, 휴대폰 잡기… 평소엔 ‘그냥 되는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하나가 작은 미션이다.
한 손으로 물뚜껑을 열다가 실패하면, 괜히 나까지 한숨이 난다. 단추 하나 채우는데 시간이 걸리면, 마음이 먼저 조급해진다. 왼손대신 입도 사용해보지만 평소엔 10초면 끝날 일이 1분이 되고, 1분이 쌓이면 하루가 달라진다.
그런데 그 느린 속도에도 나름의 좋은 점이 있다. 몸이 ‘대충’이 아니라 ‘정확’으로 움직이게 된다. 물을 따를 땐 더 조심하고, 물건을 잡을 땐 더 신중해진다. 무엇보다, 세상이 은근히 양손을 기본값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새삼 보인다. 문이 무겁고, 포장이 단단하고, 손잡이가 애매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이거다. 한 손 생활은 나에게 도움받는 법을 가르친다. 원래 나는 부탁을 잘 못하는 편인데, 지금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할 때가 생긴다. 그럴 때마다 미안함이 먼저 튀어나오지만, 나는 연습 중이다. 미안함에만 머물지 않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정확히 말하는 연습.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도 같은 손이 되어줄 수 있다는 마음을 쌓는 연습.
—
생애 첫 골절은 뼈에 생긴 금이기도 하지만, 내 일상 ‘자동 모드’에 생긴 금이기도 했다. 당연하던 것들이 낯설어지고, 낯섦 덕분에 보이던 게 보인다. 내가 얼마나 많은 편리함 위에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 위에 서 있었는지.
지금의 나는 기브스를 두르고, 오른손으로만 세상을 다시 만지는 사람이다.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이 시간은 어쩌면 내 손목뿐 아니라 내 마음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드는 시간일지 모른다.
이 글처럼. 한 키, 한 키, 천천히, 또박또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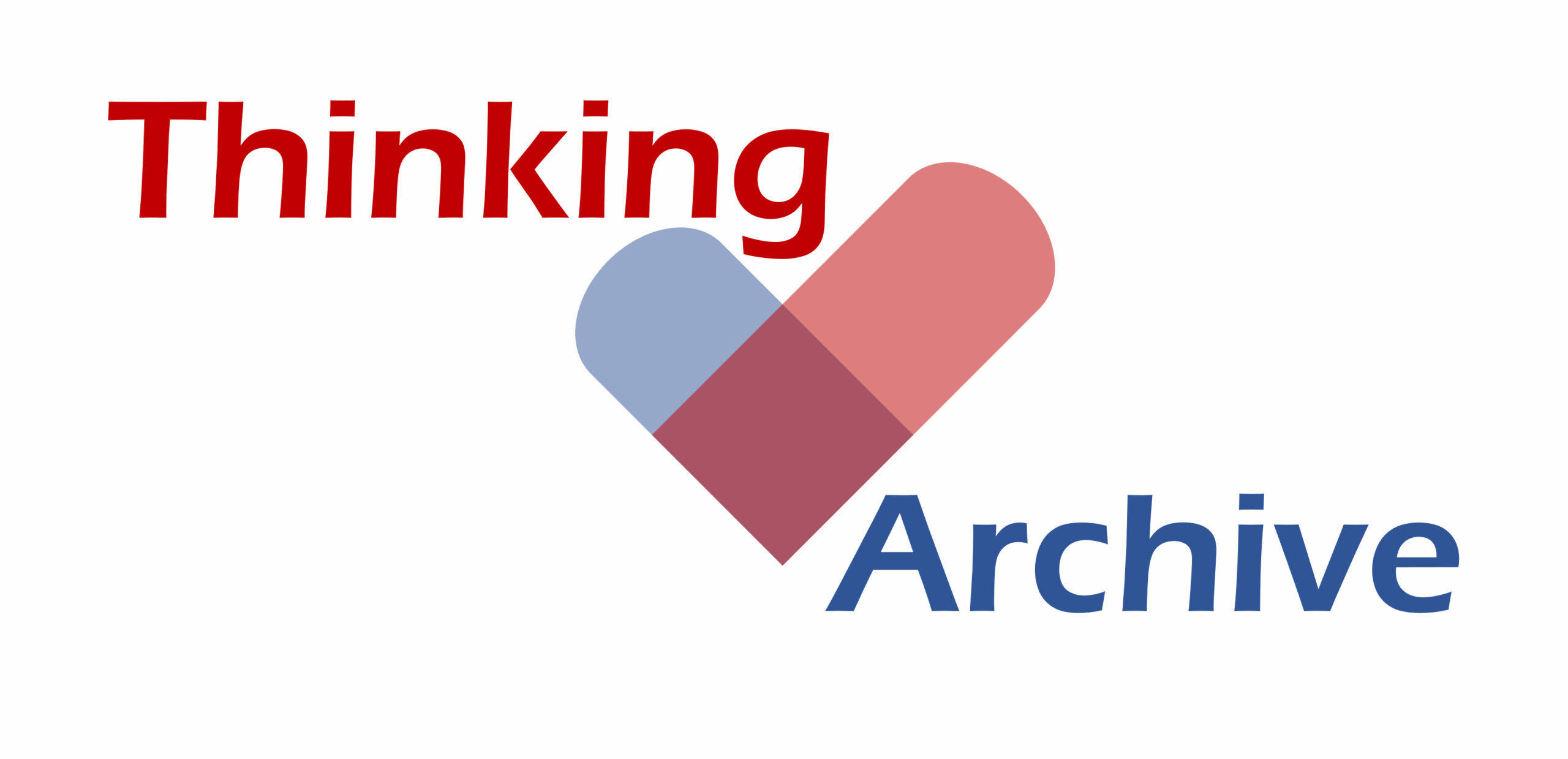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