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비평가인 조지 오웰(George Orwell, 본명 에릭 아서 블레어 Eric Arthur Blair)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웰은 그의 걸작인 소설 <1984>와 <동물농장>을 통해 전체주의의 위험성과 언어의 오용이 어떻게 대중의 사고를 지배하는지 날카롭게 비판했다. 비록 이 구절이 <1984>의 텍스트 안에 그대로 등장하지는 않으나,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가장 완벽하게 요약한 문장으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 오웰의 명언으로 인용된다.
조지 오웰은 세상 전체가 거짓이라는 안개에 싸여 있을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흔드는 강력한 저항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진실’은 거창한 철학적 담론이 아니다. 빨간 것을 빨갛다고 말하고, 고통을 고통이라고 부르는 지극히 당연한 정직함이다. 기만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이 당연함은 기득권의 설계도를 망가뜨리는 균열이 된다. 마치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누군가 던진 작은 돌멩이 하나가 얼음을 깨뜨리고 맑은 물의 존재를 알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정의하는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 혁명적 행위라는 명분 아래 또 다른 형태의 선동이나 독단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상황을 ‘기만의 시대’로 규정하는 태도는 자칫하면 세상을 향한 냉소주의나 피해망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전략적 유연함이 결여된 무모한 자기희생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문장은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에 매몰되지 않는 ‘깨어 있는 개인’의 용기를 촉구한다. 비록 진실이 상대적일 수 있다는 철학적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권력이 조작한 허구에 맞서 자신의 눈으로 본 세계를 정직하게 증언하는 태도는 시대를 막론하고 고귀하다. 기만과 타협하는 안락함 대신 진실을 선택하는 고통을 감내할 때, 비로소 인간은 시스템의 부속품이 아닌 역사의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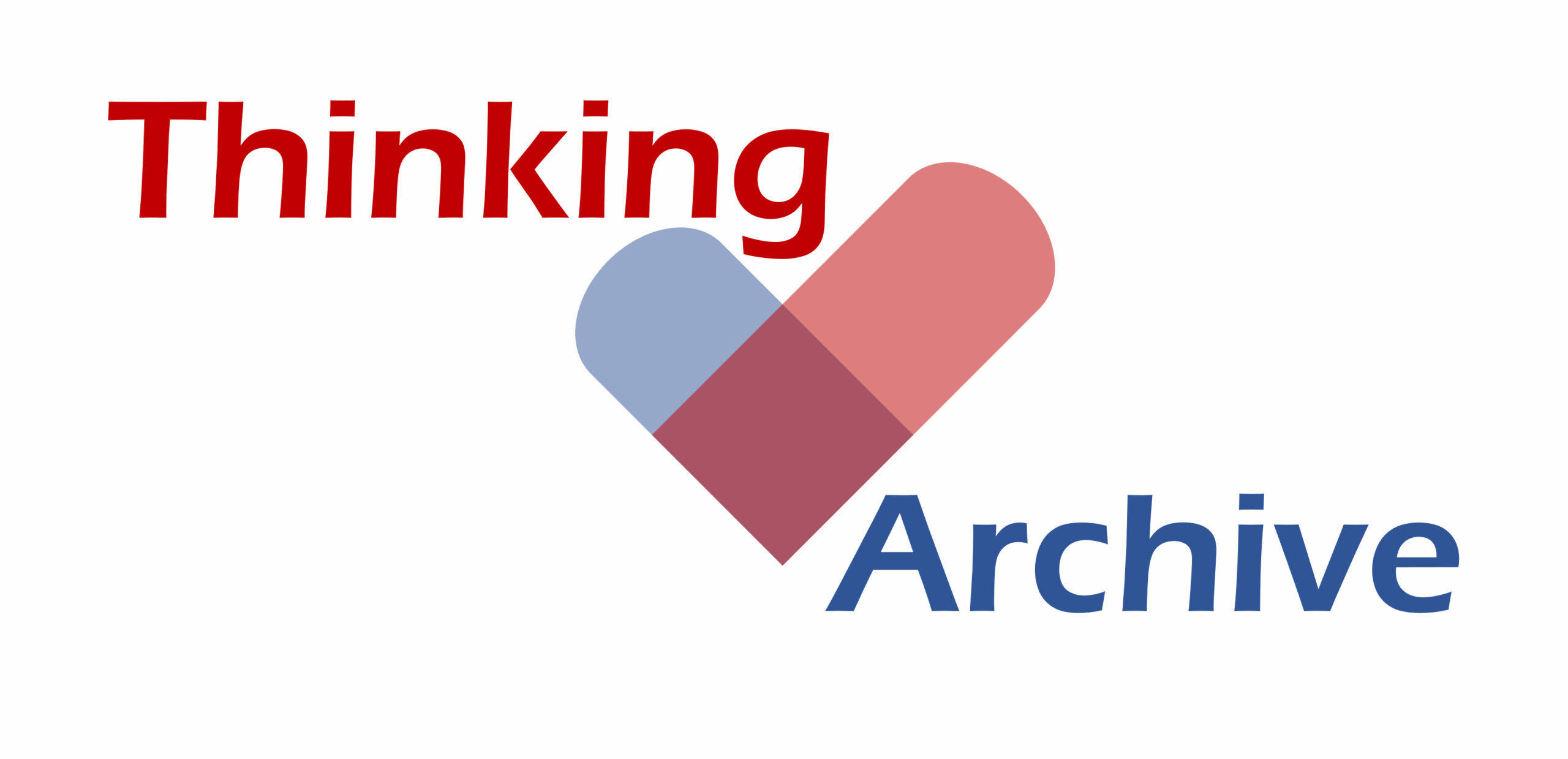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