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 처럼
황선하의 “이슬처럼”은 분명 맑고 순수한 이미지를 담고 있다. 이슬은 깨끗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며, 시인은 그 투명한 존재를 삶의 태도와 죽음의 수용으로 연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과 비유는 다소 진부하게 느껴진다. 이슬의 비유는 오래전부터 인생의 덧없음을 설명하는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그 때문에 새로움보다는 익숙함,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인생관처럼 다가온다. 삶을 이슬처럼 살고 싶다는 소망은 겸허하고 순수해서 아름답지만, 동시에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너무 순간적이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으로만 규정하는 듯하다. 그 안에는 고통을 극복하는 의지나 존재의 지속성을 바라보는 눈길보다는, 다만 덧없음에 순응하는 수동적 태도가 강조되는 듯 하다.
이 시를 읽으면 이슬의 순결함을 닮고 싶다는 바람이 따뜻하게 다가오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이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놓친 듯한 아쉬움이 남는다. 인간의 삶은 단순히 증발해 사라지는 흔적 없는 순간만은 아니다. 때로는 상처가 흔적이 되고, 사랑이 흔적이 되며, 용서와 감사가 또 다른 이의 기억 속에 남는다. 그렇기에 인생을 이슬로만 환원할 때, 삶의 연속성과 의미가 지나치게 약화되는 것 같다.
결국 이 시는 ‘순결하고 은혜로운 소멸’을 아름답게 노래하지만, 다소 무력하고 순간적인 삶의 초상으로 비쳐진다. 그래서 읽고 난 뒤 남는 감정은 청아한 울림과 함께, 인생을 보다 풍성하고 지속적인 의미로 붙잡고 싶은 아쉬움이다.
나만의 삐딱한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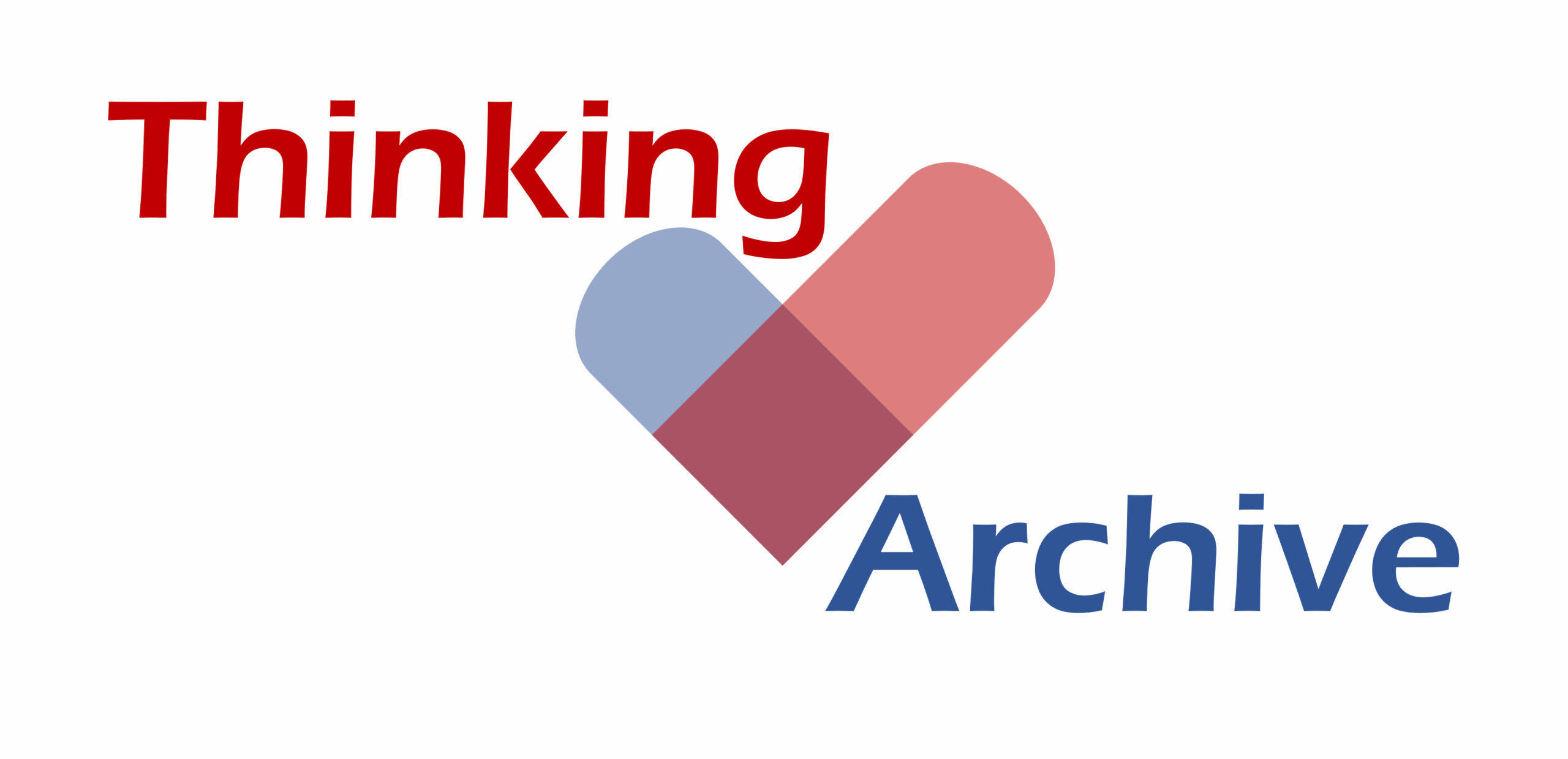
0개의 댓글